가족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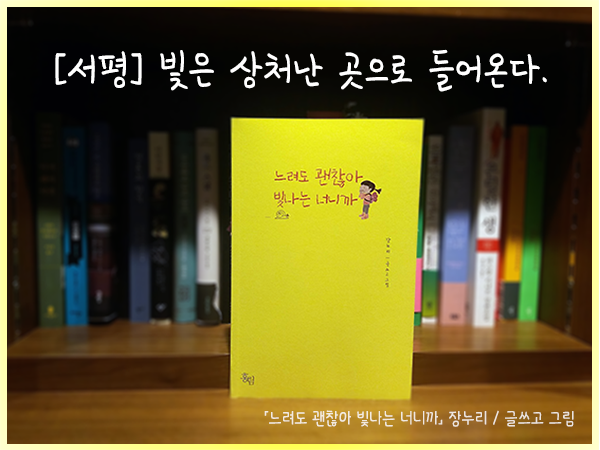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나를 공부해요. 그래도 나를 알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당신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수백 가지 방식으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내 눈 뒤에 당신을 두고, 내가 나 자신을 보듯이 나를 봐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 루미
남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남다른 아이의 부모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십 년간 발달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을 수없이 만나왔던 내게도 이런 궁금증은 항상 존재해왔다. 간접적으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일을 하던 와중에 본인도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가 된 경우를 몇 번 본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런 부모이자 치료사인 분과 밤새 대화를 나눈 기분이 들었다.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의 고민과 두려움, 세상과의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치료사로서 일해 왔던 경험이 그 위에 쌓이면서 아이의 상황과 아이를 둘러싼 세상을 보는 시선의 폭은 좀 더 넓었고 좀 더 차분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치료사의 입장과 치료를 받는 아이의 부모의 입장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 덕분에 조금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보통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은 센터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서 센터가 만만하고 문턱이 낮은 것이지 보통의 엄마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센터에 발을 들여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부담스러워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의 강력한 권유가 있으면 모를까 호기심만으로 가지는 못한다”
“내 아이가 같은 반 아이에 의해 화장실에 갇히고 맞고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 아이가 발달이 더디어 센터에서 수업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내담자의 부모를 만나면서 절대 그들의 심정을 가슴 깊숙이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과 목소리로 가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아이에게는 다음엔 어떻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해애 하는지... 책속에서 보고 익힌 매뉴얼을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데 느끼는 이 괴리감. 부모로서 느끼는 무력감과 내 안에 언제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를 강한 분노. 내게 수업을 받으러 오던 부모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고민과 갈등을 겪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는지,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기까지의 일 분 일 초의 가슴 졸이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지,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몰랐으리라.”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아직 어린 남다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민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온유 엄마로서의 고민과 갈등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보았을 고민들이기도 하고, 장애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해보지 않았을 고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고민과 갈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귀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지어 발달장애 전문가 소리를 듣는 나조차도 조금은 더 세밀하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에 대해 철저히 훈련된 나는, 내 아이가 이미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온유와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고 지나치게 고마워했다. 첫째 아이에게는 같이 어울려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면서 둘째에게는 너는 어울릴 수 없으니 피해 주지 말라며 기회도 주지 않고 격리시켜온 것이다. 미안해 말라는 이웃의 그 조언을 듣고 그래서 눈물이 났다. 창피하면서 고마웠다.”
“사소한 듯 평범한 일상 같은데, 나도 모르게 매일을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분이다. 온 몸이 가시에 긁히듯 마음에 작게 긁힌 자국들이 생긴다. 내성이 생길 만도 하지만 뜻대로 안된다. 온유를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선 잔뜩 경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다.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날 보호한다. 그게 나도 모르게 덜 상처받기 위해 체득한 내 모습인 것 같다.”
“센터 수업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더 많이 한다고 해도 당장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 만족감을 위해서, 무능감과 죄책감을 덜어보고자 이렇게 계속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운전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 가파른 계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닌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숨이 막혀오기도 한다.
사실 전체 계단의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그저 첫 번째 계단을 내딛는 수밖에 없다. 잠깐씩 계단참에서 쉬어갈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특별히 운이 좋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고통의 크기는 모두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삶은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늘 깨어있다면, 남다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는 ‘타인들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눈으로, 내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느리거나 더딘 성장을 보이는 아이의 삶을 함께 하면서 ‘견디는 삶’이 아니라 ‘배우는 삶’을 선택한다. 또는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 책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나는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분명히 더 ‘좋은 삶’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정신적인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배우게 한다. 이 배움의 과정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기도 하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고통은 괴롭기만한 고통이 아니라 필요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약이 되기도 한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을 계속 문지른다.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때로는 쓰라릴 정도로 계속 문지른다. 그러나 문지르지 않고 어떻게 빛이 나겠는가. 남다른 이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문지르고 닦아내어 빛나게 해준다.
루미라는 현자는 말했다 '빛은 상처 난 곳으로부터 들어온다'고.
- 김성남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



 인쇄
인쇄